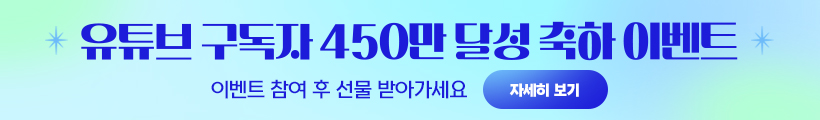AD
[앵커]
숭례문 부실 복구는 왜 빚어졌을까요?
화마에 쓰러진 숭례문을 다시 세우는 사업을 이끌었던 문화재청 간부가 이와 관련한 증언록 또는 비망록이라 할 만한 책을 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보 제1호 숭례문, 화마에 쓰러지다!
최종덕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은 YTN 속보로 이 소식을 접한 시점부터 준공 직전 갑자기 해임당하기까지 자신이 진두지휘한 숭례문 복구 과정에서 부딪힌 갖가지 문제점을 상세히 고백했습니다.
[인터뷰:최종덕, 전 숭례문 복구단장·문화재청 정책국장]
"지금까지 등한시돼왔던 전통기법을 전통재료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것도 소개를 하고 싶었죠.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을 전통기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숭례문 복구를 계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복회가 건넨 성금이 국고로 납부된 사연, 소나무 기증할 뜻을 밝힌 166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곧바로 철회한 사실을 소개한 뒤 왜 복구현장에 세운 대장간이 줄곧 개점휴업 상태였는지 설명합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제련로에서 생산된 전통철이 불량품이었고, 숭례문 복구현장의 대장간 장인들이 이 전통철로 공구와 못 등을 만들지 못해 손을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련로에서도 대장간에서도 기자들이 왔을 때에만 작업하는 시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최종덕, 전 숭례문 복구단장·문화재청 정책국장]
"철광석에서 전통 방법으로 철을 뽑는 것은 실패했는데 그렇지만 남아있는 옛날 전통 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필요한 것은 대장간에서 다 만들어서 썼죠."
또 복구현장에서 전통 방식이 아니라 제재소에서 기계로 켠 목재를 가져와 사용해야 했던 상황, 공사비를 올려달라며 목수들이 벌인 파업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들려줍니다.
최 국장은 전통기와 제작을 맡은 제와장 대신 그의 제자가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르면서 기와 공급을 제때 하지 못했던 건 그야말로 천재가 아니라 인재였다는 비판도 합니다.
이와 함께 단청 마감재로 외국산 동유를 쓰기까지 어떤 고민, 무슨 논란이 있었는지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정권이 복구를 2012년 8월 15일로 맞추라고 주문했던 사실, 2012년 12월 말로 잡은 준공이 지연될 것이라는 문화재청장의 보고에 당시 문체부 장관이 준공을 늦추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최 국장은 현판과 지붕 내부 등 왜곡돼 있던 화재 전의 숭례문 부위를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던 점을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증언록은 복구 준공식을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최 국장이 갑자기 복구단장에서 해임된 기억과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숭례문 부실 복구는 왜 빚어졌을까요?
화마에 쓰러진 숭례문을 다시 세우는 사업을 이끌었던 문화재청 간부가 이와 관련한 증언록 또는 비망록이라 할 만한 책을 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보 제1호 숭례문, 화마에 쓰러지다!
최종덕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은 YTN 속보로 이 소식을 접한 시점부터 준공 직전 갑자기 해임당하기까지 자신이 진두지휘한 숭례문 복구 과정에서 부딪힌 갖가지 문제점을 상세히 고백했습니다.
[인터뷰:최종덕, 전 숭례문 복구단장·문화재청 정책국장]
"지금까지 등한시돼왔던 전통기법을 전통재료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것도 소개를 하고 싶었죠.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을 전통기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숭례문 복구를 계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복회가 건넨 성금이 국고로 납부된 사연, 소나무 기증할 뜻을 밝힌 166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곧바로 철회한 사실을 소개한 뒤 왜 복구현장에 세운 대장간이 줄곧 개점휴업 상태였는지 설명합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제련로에서 생산된 전통철이 불량품이었고, 숭례문 복구현장의 대장간 장인들이 이 전통철로 공구와 못 등을 만들지 못해 손을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련로에서도 대장간에서도 기자들이 왔을 때에만 작업하는 시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최종덕, 전 숭례문 복구단장·문화재청 정책국장]
"철광석에서 전통 방법으로 철을 뽑는 것은 실패했는데 그렇지만 남아있는 옛날 전통 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필요한 것은 대장간에서 다 만들어서 썼죠."
또 복구현장에서 전통 방식이 아니라 제재소에서 기계로 켠 목재를 가져와 사용해야 했던 상황, 공사비를 올려달라며 목수들이 벌인 파업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들려줍니다.
최 국장은 전통기와 제작을 맡은 제와장 대신 그의 제자가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르면서 기와 공급을 제때 하지 못했던 건 그야말로 천재가 아니라 인재였다는 비판도 합니다.
이와 함께 단청 마감재로 외국산 동유를 쓰기까지 어떤 고민, 무슨 논란이 있었는지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정권이 복구를 2012년 8월 15일로 맞추라고 주문했던 사실, 2012년 12월 말로 잡은 준공이 지연될 것이라는 문화재청장의 보고에 당시 문체부 장관이 준공을 늦추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최 국장은 현판과 지붕 내부 등 왜곡돼 있던 화재 전의 숭례문 부위를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던 점을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증언록은 복구 준공식을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최 국장이 갑자기 복구단장에서 해임된 기억과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